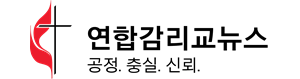(편집자 주: 이 글은 연합감리교 선교부 주재선교사(Missionary in Residence)이자 필리핀 선교사였던 최재형 목사의 “희년의 개념으로 재해석하는 기독교 선교” 시리즈 3편 중 마지막 글이다.)
 사진 제공, 최재형 목사.
사진 제공, 최재형 목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분명해지며, 또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교회가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 없이는 교회 존재의 명분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교 없이는 교회가 일치해야 할 이유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는 이 세상의 가장 보편적이고 시급한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Solving the most universal and urgent problem with God’s will and way)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의 마음을 품고, 온 마음을 다해 선교를 위해 헌신할 때, 교회는 영생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세상은 비로소 교회가 외치는 진리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계시의 대사(ambassador)로 보냄 받은(commissioned)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교 없이는 교회의 존재 이유나 교회의 일치를 위한 명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빈곤과 희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그 빈곤의 여파로 생겨난 여러 사회 병폐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은 잠자는 교회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경종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빈곤의 문제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아,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의 정부들은 빈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들의 보편적 골칫거리도 빈부의 격차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종종 의아해하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왜 대다수 빈곤국가들은 자연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가?”
필리핀을 방문한 한 사업가는 한국에 비해 너무나 풍부한 자연자원과 함께 공존하는 빈곤의 상황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가난한 것이 기적입니다!”
자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가난한 현상을 말하는 이론 중에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이론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카고학파 학자들의 연구에 근거한 이 이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이 풍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적고,
(2) 따라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의식이 약해지며,
(3) 그 결과, 독재자가 더 쉽게 활개를 치게 되어,
(4) 결국, 부패한 정부로 인해 빈곤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회분석가이자 행동가인 프레드 해리슨(Fred Harrison)은 그의 책 Silver Bullet의 2장 “자연을 원망하라 (Blame it on Nature)”에서, “자원의 저주”의 허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문제의 핵심이 “자원”이 아닌 “자원의 독점”에 있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희년의 관점에서 보면, 그 빈곤의 뿌리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연 자원의 기회와 가치를 특정 소수가 “자유”의 이름으로 독식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경제체제와 그 체제가 마치 인간의 본성 (성경은 이를 탐심으로 규정한다)에 최적화된 것으로 믿고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오늘날의 교육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 체제를 “바알주의(Baalism)”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그 체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맘몬주의(Mammonism)”라고 부르며 경고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주님의 희년운동은 그 맘몬주의에 대한 대안체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으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희년 운동” 아닙니까?
희년 소유권과 로마의 소유권
필리핀의 빈곤 문제가 중요한 선교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필리핀이 비기독교 대륙인 아시아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당과 교회 그리고 훌륭한 교회직제를 가지고 수 세기에 걸쳐 기독교 선교를 이어간 필리핀의 빈곤은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공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필리핀의 사례는 큰 틀에서 보면, 해방신학의 요람인 남미와 그 상황이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희년으로 기독교 선교를 다시 상상하는 일은 필리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와 빈곤의 공존”을 보여주는 필리핀의 시작에는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초기 스페인 선교사들은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자선도 힘써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 대신,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로마의 절대 사유재산제인 “도미니움 (dominium)”을 식민지로 가져와 적용했습니다.
서구 선교사들이 도착하기 오래전부터 현지인들은 “소유(ownership)”에 대한 그들의 철학이 담긴 소유권을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 “나의 것(Akin)”은 개인이 자신의 노동으로 만들거나 값을 지불하고 거래한 것으로, “오직 나의 것 (Exclusively mine)”이 됩니다.
- “우리의 것(Amin)”은 한 공동체가 협동으로 일구어낸 것으로, 촌락이나 논두렁과 같이 “오직 우리의 것(Exclusively ours)”이 됩니다.
- “우리 모두의 것 (Atin)”은 창조주(Bathala)가 모든 사람을 위해 공급해 준 것으로, 공기와 산 그리고 강과 바다 같이, “철저히 우리 모두의 것(Inclusively ours)”이 됩니다.
그들의 일상 언어에 배어 있듯이, 원주민들은 공유와 사유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바탕으로 유기적 소유권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그들의 소유권 원리가 희년의 소유권 원리와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초기 스페인 선교사 중에는 경건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1 하지만 강력한 왕권 아래, 식민지에 로마법을 적용(Royal Patronage)했던 당시의 시대정신을 생각할 때, 선교사들의 소유권을 실천하는 방식이 로마법이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선교사들은 복음과 로마법(Dominium)을 동시에 전달하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2
그러나 현지 원주민들은 달랐습니다.
원주민 중 대다수는 로마법에 기초한 서구의 소유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노프레 콜푸스 (Onofre Corpuz)라는 필리핀 역사학자는 식민화(1500년)에서부터 필리핀 혁명(1900년)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동안, 소수의 엘리트를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일반인은 절대사유재산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3
저는 복음과 한 꾸러미로 들여온 이 로마의 토지소유권이 필리핀 기독교 선교의 “잘못 끼워진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초기 선교사들이 “예수와 로마법”이 아닌, “예수와 성경적 희년법”을 전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희년에 대한 오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갔던 거인 골리앗처럼, 빈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윗이 물 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급소를 공격했던 것처럼, 빈곤을 뿌리 뽑을 돌이 필요하며, 구원의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희년법”이라는 돌을 지금도 교회를 향해 내밀고 계십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서 제공하는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연합감리교뉴스에서 제공하는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이 전환기적 시대에 교회는 손을 뻗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돌을 받아 쥐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코이노니아(koinonia)를 통해, 희년 정신을 선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기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오늘의 글로벌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 경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교는 정의와 사회적 거룩(justice and social holiness)보다는 자선과 개인의 경건(charity and individual piety)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중세 수도원적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한 이 시기에, 오히려 교회는 희년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며, 천상의 것들과 세속적 일들로 초점을 나누고, 교회의 에너지를 낭비하며, 심지어는 부담스러워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희년에 대해, 무지하고, 오해하며, 외면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희년에 대한 오해에는 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된 희년 (spiritualized Jubilee)”과 “이상화된 희년 (idealized Jubilee)” 입니다.
“영화된 희년”은 희년의 역사성과 사회 개혁적 요소를 제외하고 단지 종교적이고 영적인 상징으로만 희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년 주기를 어떤 일을 기념하거나 축하하는 상징으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화된 희년”은 희년을 하나의 이상(ideal)으로 보며,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적인 비전이나 고대의 한 특정 종족의 문화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기 손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삼손이 자신에게 여전히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지도자들로 넘쳐나는 교회를 보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거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만일 교회가 일치를 결단한 후, 주먹을 힘껏 쥐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뜬 채, 저 무시무시한 거인을 쳐다본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오순절 성령의 불이 교회에 임하시어, 새로운 선교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도 교회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희년을 상상하며
우리가 희년으로 기독교 선교를 상상할 수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선교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이고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치하고, 희년의 순례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어둡고, 외롭고, 소외된 곳에서 희년의 나팔(Shofar) 소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임하시기만을 염원하는 수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늦기 전에,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듬는” 희년을 선포하고, 선교적 부름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시리즈 보기
희년 정신으로 재해석하는 기독교 선교 2: 에큐메니칼 희년 선교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1. 살라잘 감독 (Bishop Salazar)은 현지인들에 대한 식민정부의 차별과 노동착취에 격렬히 반대했다. Alvin Almendrala Camba, “Religion, Disaster, and Colonial Power in the Spanish Philippines in the Sixteenth to Seventeenth Centuries,” Journal for the Study of Religion, Nature and Culture, 6 no 2, (Jun 2012): 218-219.
2. 바톨로메 데 라스 까사스 (Bartolomé de las Casas)와 같이 로마법을 남미 원주민들에게 적용시킨 후 나온 결과를 보며, 깊은 문제 의식을 가진 선교사들도 있었을 것이다.
3. Onofre D. Corpuz, An Economic History of the Philippine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1997),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