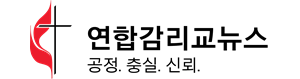1970년대 말에 유행했던 ‘모모’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모모는 방랑자 모모는 외로운 그림자/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듯이 날개짓 하며/날아가는 니스의 새들을 꿈꾸는 모모는 환상가/그런데 왜 모모 앞에 있는 생은 행복한가/인간은 사랑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모모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알듯 말듯한 철학적인 가사에 멜로디를 붙여 22살의 청년 김만준이 통기타를 치며 부른 이 노래는 대학가요제에서 수상하면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어린 시절 뜻도 모르고 흥얼거리던 노랫말을 다시 꺼낸 건 프랑스 니스에서 들려온 테러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에 유행했던 ‘모모’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모모는 방랑자 모모는 외로운 그림자/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듯이 날개짓 하며/날아가는 니스의 새들을 꿈꾸는 모모는 환상가/그런데 왜 모모 앞에 있는 생은 행복한가/인간은 사랑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모모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알듯 말듯한 철학적인 가사에 멜로디를 붙여 22살의 청년 김만준이 통기타를 치며 부른 이 노래는 대학가요제에서 수상하면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어린 시절 뜻도 모르고 흥얼거리던 노랫말을 다시 꺼낸 건 프랑스 니스에서 들려온 테러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니스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름다운 관광 도시로 연중 온화한 날씨에 강렬한 태양과 파란색 지중해로 유명한 도시 입니다. 또, 자유로운 도시 분위기와 어우러진 경제, 문화, 창의성은 마티스와 샤갈을 비롯한 많은 예술가의 마음을 붙든 예술적 감흥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사람들은 평화로운 니스 해변에서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의 날”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30분쯤 불꽃놀이를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총성이 들리더니 거대한 흰색 트럭이 인파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채 뛰기 시작했고, 트럭은 인파를 향해 지그재그로 내달렸습니다. 트럭이 지난 자리에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가득했습니다. 경찰에 의해 운전자가 사살될 때까지 “죽음의 트럭”은 약 2km를 달리며 80여 명의 사망자와 백여 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불특정 군중을 향해 테러를 감행하는 “소프트 타깃 테러’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공연장, 운동 경기장, 공항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거나 자살 폭탄 테러에 이제는 차량을 이용한 살상 등으로 테러도 점점 다양해지고,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도록 만드는 힘은 인간의 분노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 자신의 동료, 국가, 민족, 공동체가 겪는 아픔의 원인을 서방국가로 돌리고 그들을 향한 분노를 키워서 불특정 다수를 죽이는 것이 복수라는 논리에 세뇌된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분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런 마음의 상태는 “분노” 가 아니라 “증오(憎惡)”라고 보아야 합니다.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사그라들지만, 증오는 시간이 갈수록 사무치게 미워하는 감정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증오라는 한자는 “미울 증 (憎)”과 “미워할 오(惡)”로 만들어졌습니다. 미워할 “오(惡)” 라는 글자가 왠지 낯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악할 악(惡)”자입니다. 미움과 악함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미움이 악함으로 표현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미움이 악함으로 표현되는 세상은 갈수록 소망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모모”는 “자기 앞의 생(La Vie Devant Soi)”이라는 에밀 아자르(Emile Ajar)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책 뒤표지에 쓰인 ‘모모는 남자, 모모는 쓰레기, 모모는 위조지폐, 모모는 말라비틀어진 눈물 자국’ 이란 선전 문구에서 영감을 받아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라는 가사가 탄생 했습니다. “자기 앞의 생”에 나오는 주인공 모모는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아이이고 그런 아버지를 다시 만나야 하는 운명에 갇힌 아이입니다.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마저 떠나 보낸 상처와 아픔뿐인 외로운 세상에서 모모는 “날아가는 니스의 새들을” 보며 행복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소설은 행복할 수 없는 조건으로 가득 찬 삶을 행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힘을 “사랑”이라고 정의하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의 생”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맺습니다. 모모에게 ‘날아가는 니스의 새들을’을 바라보는 것이 희망이라면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테러로 상처 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니스에는 상처투성이인 모모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니스에 새들이 다시 날아오를 때쯤 새로운 희망도 함께 쏟아 오를 것입니다. 그 상처마저도 “사랑”으로 감쌀 때 ‘니스’는 “자기 앞의 생”을 책임지는 사람들로 가득 찬 행복한 도시, 이름처럼 ‘나이스(Nice)’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글쓴이: 이창민 목사, LA연합감리교회,CA
올린날: 2016년 7월 18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