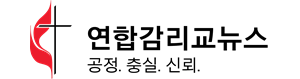한복을 입은 도로시 오글 여사. 출처, darrellhowemortuary.com.
한복을 입은 도로시 오글 여사. 출처, darrellhowemortuary.com.1959년 남편 조오지 오글(George E. Ogle) 목사와 함께 한국에 파송되어 산업 선교, 인권,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도로시 린드먼 오글(Dorothy Lindman Ogle) 선교사가 2025년 10월 30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9세였다.
도로시 오글 선교사는 한국의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섬기며, 민주화를 위한 길을 함께 걸어온 평화의 일꾼이었다.
시카고에서 한국으로 ― 젊은 간호사의 결단
1935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난 도로시 린드먼은 스웨덴계 조부모 밑에서 성장했다. 의사인 아버지와 간호사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도로시 역시 시카고영아복지회(Chicago Infant Welfare Society)에서 공공보건 간호사로 일하며 도시 빈민과 청년층의 건강 문제 해결에 헌신했다.
그녀의 인생은 한 강연회에서 전환점을 맞았다. 도시 청년과 약물 사용 문제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젊은 감리교 선교사 조오지 오글을 만난 것이다. 1959년 5월 결혼한 그들은 도로시의 24세 생일을 앞둔 그해 12월, 화물선을 타고 인천항에 도착하며 한국 선교의 첫발을 내디뎠다.
산업 선교와 민주화를 향한 동행
한국에서의 15년은 단순한 체류가 아니었다.
조오지 오글 목사는 산업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드는 현실을 목도하며, 노동자 사역의 필요를 절감했다. 오글 부부는 듀크 신학교 시절 인연을 맺은 마경일 목사와 함께 감리교단의 지도부를 설득해 인천 화수동의 초가삼간을 매입하고, 도시산업선교회의 전신인 인천산업전도회(Incheon Industrial Evangelism)를 설립했다. 이 모임은 훗날 인천도시산업선교회(Incheon Urban Industrial Mission)의 모태가 되었다.
남편이 사역하는 동안, 도로시 여사는 네 자녀(마틴, 캐시, 카렌, 크리스틴)를 모두 한국에서 낳고 기르며 한국 학교에 보냈다. 그녀는 아이들을 오전에는 한국 학교에 보내고, 오후에는 집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또한 선교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지역 여성들과 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 사역과 교회학교 사역의 경계를 허물었다.
1971년 오글 목사는 도시산업선교회의 리더쉽을 한국인에게 넘겨주고, 박사학위를 마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와, 위스컨신 주립대학교에서 1973년 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다시 서울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5년 임기의 교편생활을 시작했다.
1972년 10월 17일 한국에 유신헌법이 선포되자, 대학가에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이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목회자들과 교수들도 공공연히 체포되었다.
오글 목사는 기독교 수감자 가족들이 목요일마다 주최하던 목요기도회에 참석해,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이유로 1974년 12월 14일 한국에서 추방되었다. 도로시 여사와 가족 역시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의 인혁당 사건 선고 확정 18시간 만에 한국 정부는 관련자 8명 전원의 사형을 집행했다.
오글 목사는 미국으로 추방된 후에도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인혁당 사형 집행 소식을 들은 뒤 견디기 힘든 괴로움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도로시 여사는 훗날 회고록 Our Lives in Korea and Korea in Our Lives (2012)에서 “한국에서의 세월은 우리 삶의 중심이었다.”라고 회상했다.
미국에서 펼쳐진 평화와 인권 사역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오글 부부의 한국을 향한 헌신은 멈추지 않았다. 조오지 오글 목사는 애틀랜타의 에모리대학교 캔들러 신학교(Candler School of Theology)에서 교편을 잡고 새로운 세대의 목회자를 양성하다 이후 연합감리교회 사회부(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에서 사회경제정의 담당 디렉터로 섬기며, 1991년에 은퇴할 때까지 사회 정의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도로시 여사는 워싱턴 D.C.를 기반으로 한 북미인권연구소(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미국 의회와 교회 및 시민사회에 한국 인권과 평화 문제를 꾸준히 알렸다. 또 1984년에는 미국친우봉사회(AFSC)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평생의 사명을 재확인했다.
오글 목사 부부는 1984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 강사로 초청받아 추방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과 1999년 부산 민주공원 개원 등에 초청받아 다시 한국을 방문했고, 2002년 한국을 방문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부터 인권상을 수상했다.
오하이오 감독구를 섬기는 정희수 감독은 “도로시 선교사님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옹호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라며, 도로시 선교사가 북미인권연구소를 통해 회의와 브리핑, 그리고 의회 방문을 주도했던 기억을 회고했다.
정 감독은 이어 “1984년 평양 방문 이후 그녀는 ‘진정한 평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믿음과 양심의 동반자
“도로시 오글 사모님은 나에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믿음과 양심의 동반자였고, 복음이 요구하는 가장 깊은 정의와 화해, 자비의 삶을 몸소 살아낸 믿음의 누이였습니다.”
정희수 감독의 이 고백은 도로시 여사가 동료들과 선교사,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 감독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억눌린 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때, 도로시 사모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양심수들의 목소리가 침묵 당할 때, 그분은 교회와 세상 앞에 그들의 울부짖음을 전하기 위한 길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도로시 선교사의 사역은 단순한 감정적 열정이 아니라, 단련된 믿음과 뜨거운 양심으로 평화와 인권을 향한 ‘거룩한 책무’를 실천한 삶이었다.
 1971년 7월 4일, 조오지 오글(George E. Ogle) 목사가 박사학위를 마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 소속 교회였던 인천 숭의감리교회에서 열린 송별회를 마치고 찍은 기념사진. 사진 속에는 조오지 오글(George E. Ogle) 목사와 도로시 오글(Dorothy L. Ogle) 선교사 부부가 함께 서 있으며, 오글 목사 옆에는 당시 감독이자 훗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으로 선출된 이호문 목사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 제공, 인천 숭의감리교회.
1971년 7월 4일, 조오지 오글(George E. Ogle) 목사가 박사학위를 마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 소속 교회였던 인천 숭의감리교회에서 열린 송별회를 마치고 찍은 기념사진. 사진 속에는 조오지 오글(George E. Ogle) 목사와 도로시 오글(Dorothy L. Ogle) 선교사 부부가 함께 서 있으며, 오글 목사 옆에는 당시 감독이자 훗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으로 선출된 이호문 목사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 제공, 인천 숭의감리교회. 한국 목회자와 노동운동 세대의 기억
뉴욕 후러싱 제일 연합감리교회의 김정호 목사는 오글 선교사 부부에 대해 “진짜 복음주의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들이었다. 온몸으로 한국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로시 여사를 이렇게 회고했다.
1995년 우리 조국 해방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당시 ‘희년협의회’와 ‘해방 50주년 대축제협의회’가 백두산 소나무로 십자가 3만 개를 만들었는데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고 이승만 목사님을 비롯하여 고 오글 목사님 등 50주년 축제에 참여했던 어른들이 한 박스씩 가지고 오셔야 했었다. 십자가 한 박스를 내게 전달하면서 “김 목사, 나 이거 들고 미국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나 같은 늙은이에게 무거운 짐 배달 심부름이나 시키고 참 버릇없다.” 하시면서 웃으셨다. 옆에 계시던 도로시 사모님이 “아이고, 당신에게 이런 심부름이라도 시켜주니 고마운 줄 알아요.”라고 하셨다.
이어 김 목사는 “우리 조국의 오늘은 사모님과 오글 목사님 같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라고 전했다.
황병배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총무)는 “오글 부부는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 시기에 노동자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 감리교회가 참된 종의 리더십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감리교회 고등교육사역부를 섬기다 은퇴한 윤길상 목사는 “도로시 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정의와 평화를 실천한 사도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윤 목사는 “오글 선교사 부부의 삶을 통해 저의 87년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산업 노동자들과 조국 사회 여러 영역을 위해 헌신한 오글 부부의 사역에 깊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기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추모의 말을 전했다.
마지막 사랑의 여정과 남은 유산
은퇴 후 두 사람은 콜로라도주 라파예트에 정착했다. 도로시 여사는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던 남편을 끝까지 간호하며, ‘사랑이 섬김이 되는 삶’을 보여주었다. 남편 조오지 목사는 2020년 11월 15일, 향년 91세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도로시 여사는 그로부터 5년 뒤인 2025년 10월 30일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도로시 선교사는 자신의 노년에 대해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음악과 영화,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다.
 연합감리교뉴스에서 제공하는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연합감리교뉴스에서 제공하는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두 사람은 각기 회고록과 역사소설을 남겼다. 조오지 목사의 대표 저서인 How Long, O Lord: Stories of Twentieth Century Korea는 함정례 목사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어 <기다림은 언제까지 오 주여!―20세기 한국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 부부는 단순히 한국에 머물렀던 선교사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하고, 한국의 산업화·민주화·인권운동의 역사 속을 함께 살아낸 신앙의 동역자였다.
오글 부부의 유산
조오지 오글 목사는 생전에 “노동자들이 조직되어야만 그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그로써 건강한 사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의 강제 추방은 감리교 선교가 단순한 복음 전파를 넘어 사회적 정의와 인간의 존엄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도로시 여사 역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방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을 잇는 인권 네트워크를 통해 정의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그들의 삶은 복음 선교와 사회정의, 그리고 평화 운동이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한 신앙의 여정임을 증언한다. 도로시 선교사는 예리한 지성과 평화·인권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정희수 감독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도로시 사모님의 친절은 변함이 없었고,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헌신은 생의 마지막까지 이어졌습니다. 도로시 사모님의 소천은 화해와 자비의 세상을 꿈꾸던 우리 모두에게 깊은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이제 도로시 사모님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히 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여전히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지는 평화의 노래요, 시간을 넘어 지속되는 사랑의 증언으로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가족과 추모예배 안내
도로시 린드먼 오글(Dorothy Lindman Ogle, 1935년 12월 28일 – 2025년 10월 30일)의 유족으로는 형제 로버트(Robert), 리처드(Richard), 폴(Paul)과 자녀 마틴(Martin), 캐시(Kathy), 카렌(Karen), 크리스틴(Kristine), 그리고 6명의 손주가 있다.
5년 전 소천한 남편 조오지 오글(George E. Ogle, 한국명 오명걸,1929년 1월 17일 – 2020년 11월 15일) 목사는 연합감리교뉴스에 한국 노동자와 약자의 아버지 조오지 오글 목사 하나님 품에 안기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추모예배는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콜로라도주 볼더 소재의 Frasier Meadows 4층 예배당 (350 Ponca Place, Boulder, Co 80303, 전화 303-499-4888)에서 열린다.
가족들은 꽃 헌화 대신 연합감리교 구호위원회(UMCOR)의
국제재난재건(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기금에 기부하기를 권하며, 기부 메시지 란에 “In memory of Dorothy Lindman Ogle”이라 명기하면 된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4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