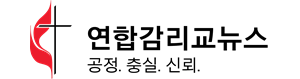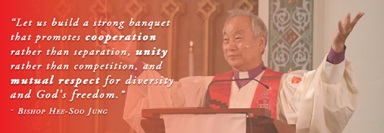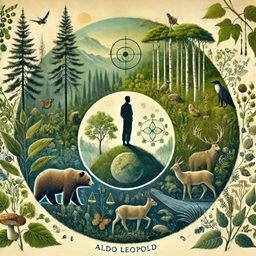이수일과 심순애의 이야기는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소설 금색야차(金色夜叉)를 조중환이 장한몽(長恨夢)이라는 제목으로 번안한 소설이다. 위키백과에 실린 줄거리를 옮겨본다.
"이수일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아버지의 친구 심택의 집에서 그의 딸 심순애와 함께 성장한다. 그리고 어버이들의 뜻에 따라 두 사람은 약혼한다. 어느 날 두 남녀는 서울 부호인 김씨 집으로 초대받아 갔다가 도쿄 유학생인 그 집 아들 김중배를 알게 되고 심순애는 김중배의 보석에 유혹된다. 심순애의 부모도 이수일과의 혼약을 파기하고 김중배와 결혼시킨다. 실연한 이수일은 돈에 대한 원한으로 고리대금업자가 된다. 심순애의 결혼생활도 죄책감 때문에 불행해지지만 이수일은 냉담하다. 고민하던 심순애는 비관하고 대동강에 투신자살을 기도했으나 우연히 이수일의 친구 백낙관에 의해 구출된다. 백낙관은 이수일에게 재회를 권하지만 이수일은 금전에만 몰두할 뿐 듣지 않는다. 결국 이수일도 신경쇠약으로 휴양 차 청량암에 머무는 동안 자살하려는 어느 남녀를 구출해주고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다. 한편 심순애는 친정으로 돌아와 이수일에 대한 연모의 정이 지나쳐 광증을 일으킨다. 그리고 백낙관의 중재로 이수일과 심순애는 결국 서로 과거를 뉘우치고 재회하게 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이 돈에 의해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어디선가 "사랑이 밥 먹여 주냐?"는 소리가 금방 들리는 것만 같다. 왜 이리도 사랑이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지? 아무리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인생의 본질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감을 지켜 주는 사랑의 거룩함에 있음을 왜 뒤늦게야 깨닫는 것일까? 보석의 광채가 오히려 영혼을 허탈하게 하고, 사랑의 뿌리가 아픔과 상처로 송두리째 파헤쳐지고 나서야, 인생의 줄기가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급기야 발견한 것이리라.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은 사랑이 진짜임을 말해 준다. 닥터 지바고의 이복 형인 예브그라프 장군이 닥터 지바고의 딸인 토냐에게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토냐는 "혁명의 와중이었고, 거리는 불에 휩싸였고, 너무도 복잡하다 보니 도망 중에..."라고 얼버무린다. 그러자 재차 예브그라프 장군은 "헤어진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러자 타냐는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을 실토한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았어요."
이 때 예브그라프 장군은 토냐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진실을 말해주마. 네 손을 놓은 코마로프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 만일 그가 네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사람이 많고 복잡하여 도망치는 신세라 할지라도 절대 네 손을 놓지 않았을 거야."
혁명과 전쟁 중일지라도 사랑의 진가를 말해주는 소설이었기에 노벨 문학상으로 결정되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잔혹함을 드러낸 글이므로 소련 내의 반대로 결국 노벨상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
지난 911 사건이 났을 때에 그 빌딩 안에 갇힌 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족에게 전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사랑"이었단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을 알지! 꼭 기억해줘!"
"당신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나도 당신하고 산 것이 너무 행복했어. 사랑해요."
"여보, 아이들에게도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더 이상 전화가 없었고, 그 빌딩은 무너져 내렸다. 죽음 앞에서 할 말이 그 말이었던 것이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사랑"이었음을 알게 한다.
글쓴이: 이선영 목사, 덴버연합감리교회 CO
올린날: 2013년 2월 14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