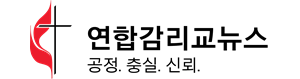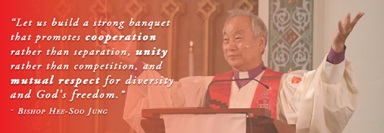제법 시간이 지나서일까? 기억이라는 말로 조금씩 더듬어야 생각이 하나 둘 떠오르니 말이다. 그렇다고 강산이 몇 번 바뀔 만큼의 시간도 아니고 기껏해야 낡은 책장에 먼지가 조금 앉아 내릴 만큼의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좀처럼 기억의 태엽이 생각 같지 않다. 늘 마음은 대추나무를 품어 안은 시골집 담벼락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몸이란 녀석은 이국 풍토에 적응이 되어 버린 모양이다.
여름 내내 함께 뛰놀던 아이들이 제 집으로 돌아가고, 같이 떠들던 매미 떼 소리가 잦아들면 그 때부터 시골 마을에 한적한 가을이 찾아오곤 했던 기억이 난다. 어린 마음에도 떠나 보내는 마음의 허전함이 새 학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중압감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곤 했었다. 하지만 내년 여름을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만큼 했으랴. 꺼내지도 못할 만큼 마음 저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걸 보면.
그 때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들고 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행여 내 기억이 시계추처럼 마치 제자리만 왔다 갔다 하듯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버클리 캠퍼스를 끼고 앉은 교회에 지금 내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무일푼의 기억여행을 반복해 누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들이 대개 그렇듯이 여름이 끝날 무렵인 8월 말에서 9월 초 가량 새 학기가 시작하여 이듬해 5월이면 모든 학교의 일정이 마무리 된다. 개인으로 볼 때는 그렇게 4년을 보내면 마지막 해 5월에 졸업을 하고, 또 다른 인생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캠퍼스와 가까운 거리에 교회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학생들의 왕래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인지 교회의 1년 주기도 학생들의 학기에 맞추어 9월에 시작하여 5월에 마무리하는 매우 독특한 캠퍼스력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여름은 교회에 계륵이거나 혹은 재충전의 애매한 처지에 놓이기 십상이다. 떠난 이들의 빈자리를 생각하면 차라리 계절 하나쯤 건너 뛰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발칙한 생각을 해보다가도, 이내 잔칫상을 물리고 한시름 놓으며 새롭게 맞이할 새내기들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오르는 것 역시 바로 이 즈음이다.
하지만 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다가올 미지의 기억들보다 이미 가슴에 새겨진 기억들인 법. 지나간 4년 동안 가슴으로 낳고 품은 아이들이 제 갈길 찾아 떠난다고 내 마음일랑 아랑곳하지 않고 날 앨범의 한 켠으로 밀어 넣을 때의 그 심정은 무엇에도 견주기 어렵다. 십자가를 뒤로 하고 떠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의 심경이라 하면 불경스럽기 그지없고, 출세길 찾아 집 나서는 아들을 애처로이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라 하자니 솔직히 양심이 따끔거린다. 그렇다고 날 버리고 떠난 님 정도로 에두른다 해도 낯간지럽기는 마찬가지다.
테레사 수녀가 그랬다는데, "우리 모두 그분의 일을 잠시 하다가 갈 따름이다."는 말을 나도 이쯤 해서 넉살 좋게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큰 뜻을 품어야 할 주의 종답지 못하게 그릇이 작아 가슴도 쉽게 적신다. 그래서 때론 송구스럽기까지 하다. 잠언에 이르기를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 (27:19)"고 한다. 지금 같아서는 떠나는 아이들 얼굴과 마음에 내 조그만 흔적 하나라도 남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마음에 내가 북극성이 되어 뭇 별이 바라봄 같이 되고픈 마음은 없다. 그저 짧은 인연의 끈을 기억의 타래에 묶어 두고픈 게 문제라면 문제지.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시간은 흘러서 나를 이미 기억의 저편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가 길어서 아이들의 그림자도 길게 느껴졌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짧아진 해처럼이나 그 오지랖이 좁아졌다. 아마도 새 얼굴맞이 할 때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일까? 그 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이 어느새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려 하고 있다.
글쓴이: 권혁인 목사, 버클리한인연합감리교회 CA
올린날: 2013년 9월 3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