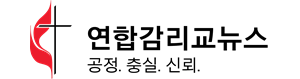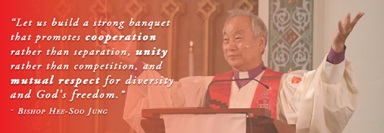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름철 막바지인 8월 말이 오면 가슴이 설레곤 했다. 왜냐하면, 내 생일이 바로 개학 날인 9월 1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날이 더 특별했던 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의 생일도 같은 날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아버지와 같은 날 생일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여러 가지 '특수'를 누린다. 가장인 아버지와 막내 아들의 생일이 한 날이라 기억하기 쉬워서인지, 가족들도 내 생일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고, 또 이 날은 친척 어른들이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면서 종종 내 생일도 기억해 주어 자라는 동안 적지 않은 부수입도 쏠쏠했던 기억이다. 생각해 보면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 없던 형이 장남으로서 집안의 월등한 기대와 귀여움을 받았지만 형은 어린 시절 이런 '특수'를 누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이런 특권은 아버지와 생일이 우연히 같았던 내게만 주어졌던 축복이었으리라.
올해도 9월이 다가오니 어린 시절의 습관처럼 가슴이 좀 설렐 법 한데, 왠지 마음 한 켠이 마냥 허전하기만 하다. 아버지가 지난 봄, 소천하셨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니, 이제껏 처음 맞는 '혼자'만의 생일인 것이다. 돌아보면, 거의 30년 전 미국에 온 이후, 한 번도 아버지 생신을 제대로 챙겨 드리지 못한 것이 적지 않게 마음에 걸린다. 매년, 뉴욕시간으로 8월 말일 저녁시간이 되면 서울에 전화를 드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미 그 곳은 9월 1일 아침. 마치, 정해진 의식을 치르듯 아버지께 '생신 축하 드린다'고 말씀 드리면 아버지께서는 '건강'에 대한 덕담과 '성실함'에 대한 권면을 주시곤 했었다. 말씀이 그리 많지 않으셨던 분이었기에 곧 어머니에게 전화를 바꿔 주시면 난 오히려 어머니와 긴 대화를 이어가곤 했다.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의 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도,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 주고 받던 생일축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던 아버지와 나만의 의미 있는 연결고리였다.
그런데, 올해는 어찌해야 할까 걱정이 앞선다.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 아버님 생신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내 생일에 대한 덕담을 들을 생각을 하니 떠나가신 아버님의 빈 자리가 벌써부터 새삼 그리워진다. 지난 봄, 낙상으로 인한 수술을 하신 후, 아버지는 한 동안 회복하지 못하시고 '치매증상'과 비슷한 정신적 혼란을 겪으셨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 이국에서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던 중, 하루는 어머니가 화상대화로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셨다. "글쎄, 어젯밤, 아버지가 밤새 헛소리를 하셔서 간병인 아주머니도 한 숨 못 잤단다. 그런데, 밤새도록 당신께서 누군가를 찾으셨다는데, 잘 들어보니 '학순아, 학순아,' 하시면서 너를 찾더란다. 아주머니가, '학순이가 누군데, 밤새 그렇게 찾으세요?' 이렇게 묻더라." 그리곤, 나도 어머니도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자잘한 정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어도 깊은 정으로 항상 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아버지, 당신께서 사경을 헤매시면서도 막내 아들을 밤새 찾으신 것이다.
사실, 아버지와 난 기질이나 성향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당신의 삶과 사고방식이 종종 내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모범'을 지향하는 교과서적인 것으로 느껴지곤 했었다. 이로 인해, 젊은 시절, 적지 않게 아버지의 고지식함에 대한 반항심리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나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모두가 자식이 잘 되라고 보여주신 당신의 바램이요 노심초사이었던 것을 비로소 깨달아가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릴 기회 조차 없이 너무 갑작스레 가신 것이다. 돌이켜보면, 아들이 집안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을 때나 외국인 며느리를 보실 때도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던가? 말로만 듣던 '부모는 자식의 효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풍수지탄(風樹之嘆)이 내 고백이 되었다. 지난 봄, 부음을 듣고 경황없이 귀국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가슴 속엔 회한(悔恨)이 가득 찼지만,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아쉬움 하나가 요즘 나를 엄습하곤 한다. 당신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사뭇 후회가 되는 것이다. 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에, 항상 믿음직하지 못해 걱정거리였던 막내 아들이 오랜 투석으로 앙상해진 그 손이라도 꼬옥 잡아드리면서, "아버님, 고마웠습니다. 평생, 제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고마웠어요." 이렇게 한 말씀 드릴 수 있었더라면. 생전에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기만 하다.
이번 가을, 한국에 가면 파주의 통일동산에 위치한 아버님 산소를 방문해 할 일이 하나 있다. 묘비석을 돌아보고 확인하는 일이다. 지난 봄, 장례 후 급히 뉴욕으로 돌아온 나는 서울의 형과 이 메일로 전화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묘비석을 만들었는데 이를 꼭 직접 확인하고 싶다. 묘비석의 앞면에는 이 생에서의 여든 두 해, 당신의 고단하지만 보람 있었던 한평생을 기려 자식들이 정성 들여 고른 성경구절이 음각되고, 뒷면에는 남기신 글 가운데 한 문장과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이름들이 새겨지도록 했다. 성경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ellipsis;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를 골랐고, 당신이 남긴 글로는 회고록 '막고동 소리'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절대자를 믿고 내세를 기다리며, 우주의 순리에 순응하여 남은 시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땅한 길이리라."를 옮겼다.
생각해 보니 산소에 가서 묘비석을 둘러보고 난 후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더 떠오른다. 아버지는 평소 커피를 좋아하셨지만 노후에는 건강 때문에 맘껏 드시지 못했다. 그래서, 아침이면 아들이 마시던 커피 한 두 모금을 자주 사정해 드시곤 했다. 그 '커피 한 잔' 그득히 따라 묘석 위에 올려 놓고, 큰 절 올리면서 '아버지, 고마웠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생전에 못다 드린 말씀, 목놓아 한 번 꼭 외치고 싶다. 앞으로 몇 해가 더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혼자 맞아야' 하는 생일에, 아버님께 생신축하는 더 이상 드릴 수 없음을 나는 안다. 하지만,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뵐 때까지 매해 '우리의 생일'이 돌아오면 대신 이렇게 인사 드리며 아쉬움을 달래리라. "아버님, 고맙습니다."
글쓴이: 장학순 목사,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장 NY
올린날: 2013년 8월 15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